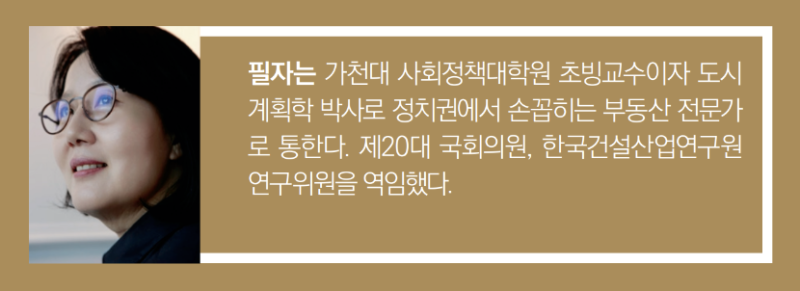병원비 걱정과 주거비 부담 사이, 서글픈 현실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가족들의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민생’과 ‘생존’일 것이다. 과거의 자식 자랑 대신 은퇴 후 노년의 삶에 대한 실존적 불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행복의 조건이 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537만원이다. 이 중 본인 부담금은 10~20% 내외라지만 ▲치아 ▲관절 ▲안과 질환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시술에는 비급여 항목이 산재해 있다. 수술이나 암치료를 한 번 겪게 되면 그 부담은 가계 경제를 흔드는 수준이 된다. 그나마 내 집이라도 소유한 이들은 이 비용만 걱정하면 되지만 전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노년층에게 주거비와 의료비의 이중고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이다.
청년층의 고단함 역시 만만치 않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이들은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오늘을 버텨내는 데 급급하다. 암 진단 연령이 낮아지며 청년 암환자도 늘고 있다. 미리 목돈을 마련해두지 못한 청년들에게 질병은 곧 빈곤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결국 최근 가족 간 대화의 흐름이 ‘돈 버는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올해는 주식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투자 자금 규모가 미미하거나 오늘 하루를 버티기 급급한 다수에게 주식시장의 호황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르다. 자가든 전월세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국민들의 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자산의 2/3가 집에 묶여 있는 노인들에게 집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집은 삶의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슬 퍼런 공격뿐이다. 부동산을 오직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두고 주택 소유와 대출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
비거주 주택 향한 칼날, 서민 생계형 주거 외면한 독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최근 급격히 변화조짐을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며 날 선 공격을 쏟아내는 모습은 행정부의 정책적 숙의를 무색하게 만든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상정하는 투기꾼 마귀의 실체가 얼마나 모호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있는지 드러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 가구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50.8만 가구(12.2%)다. 정부는 이 숫자를 투기 세력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통계의 이면을 보면 실체는 사뭇 다르다. 50.8만 가구 중 85%에 달하는 약 43만 가구는 2주택자다. 진짜 투기 의심을 살 만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서울 가구의 단 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2%의 표적을 잡겠다며 12% 전체를 마귀로 몰아세우는 셈이다. 더욱이 서울 거주 2주택자의 두 번째 집이 모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상당수는 서울에 거주하며 고향의 노후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제주·강원 등지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이들이다.
다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이 강남이 아니라 제주(20.1%), 충남(17.4%), 강원(17.3%) 순이라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비거주 주택’ 중과세 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독선이다. 고용 불안과 직장 이동이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지방 발령 등으로 이사하며 삶의 터전이었던 서울 집을 차마 팔지 못하고 임대를 준 채 이동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서민들의 ‘생계형 주거 전략’이다. 그럼에도 “거주하지 않는 집은 무조건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 각자의 삶의 궤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폭력일 뿐이다.
생활인구 증가와 민간 임대 역할 부정하는 자가당착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 시대는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하드웨어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지방과 관계를 맺고 그곳에 머물며 소비하고 정을 붙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 핵심 고리가 바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보유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생활인구’ 전략이다. 기술 발달과 유연근무제로 ‘5도 2촌’을 넘어 ‘4도 3촌’의 삶이 대중화됐다. 이 흐름 속에서 지방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지방 소멸을 막는 가교다.
임대사업자가 유휴 주택을 관리해 공급하는 임대 물량은 지방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들을 오직 ‘불로소득 수혜자’로만 규정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정작 지방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임대 시장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을 관리하며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향적인 유인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안정적인 거처를, 지방에는 인구 유입의 통로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외면한 채 부동산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가두는 것은 결국 지방의 고사를 재촉하고 민생의 파탄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가 겨눈 총구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투기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병원비를 걱정하는 고령층과 지방의 평범한 소유자들이 대다수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국민이 기대한 것은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날 선 공격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따뜻하고 실용적인 민생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선동적 수사를 거두고, 통계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지방의 절실함을 읽어내는 실용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6/02/22/0000093431_001_20260222140008489.jpg?type=w860)